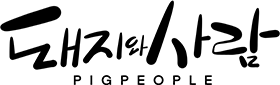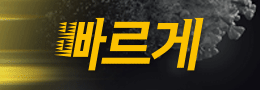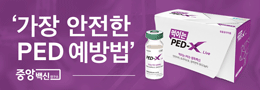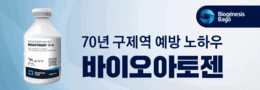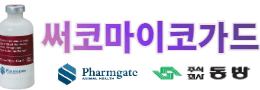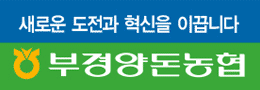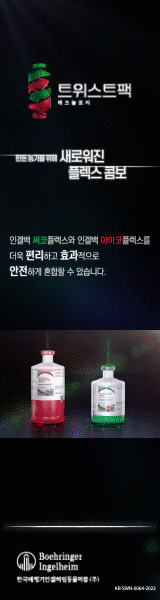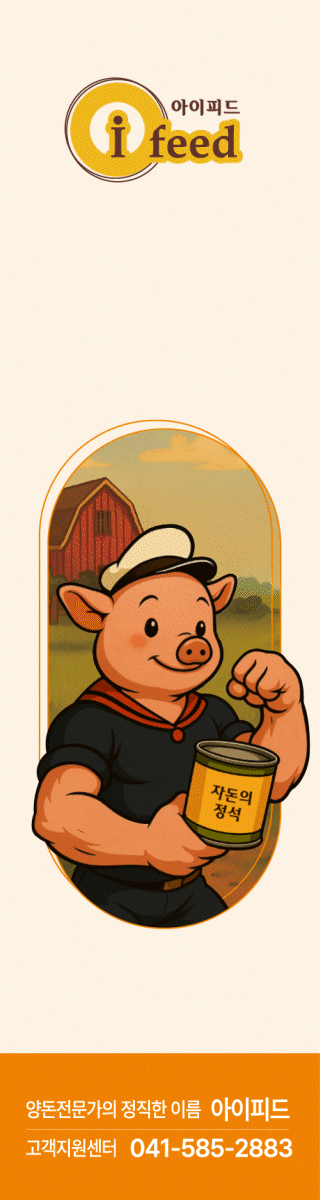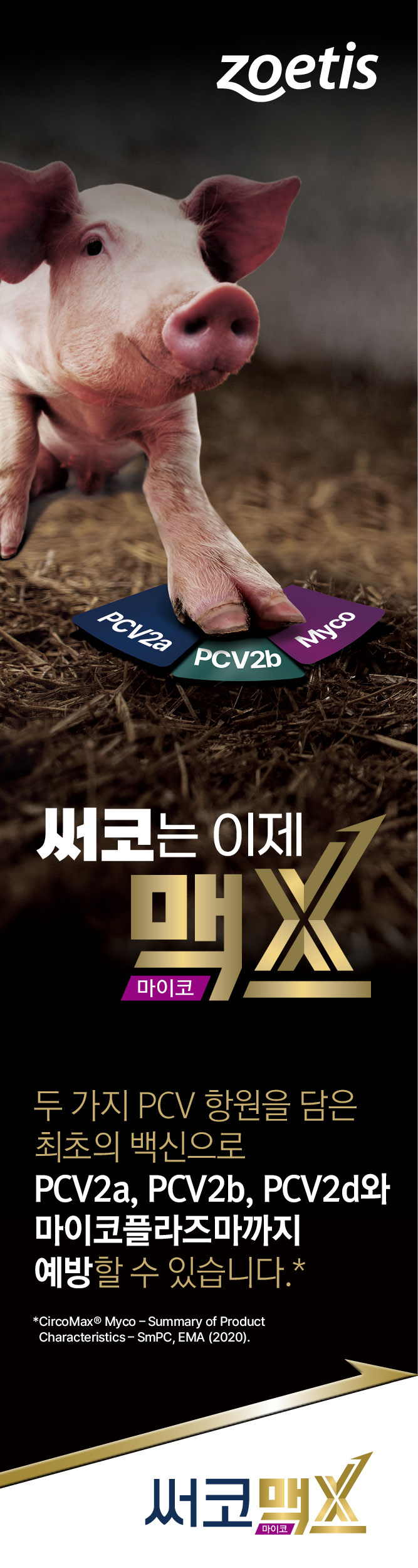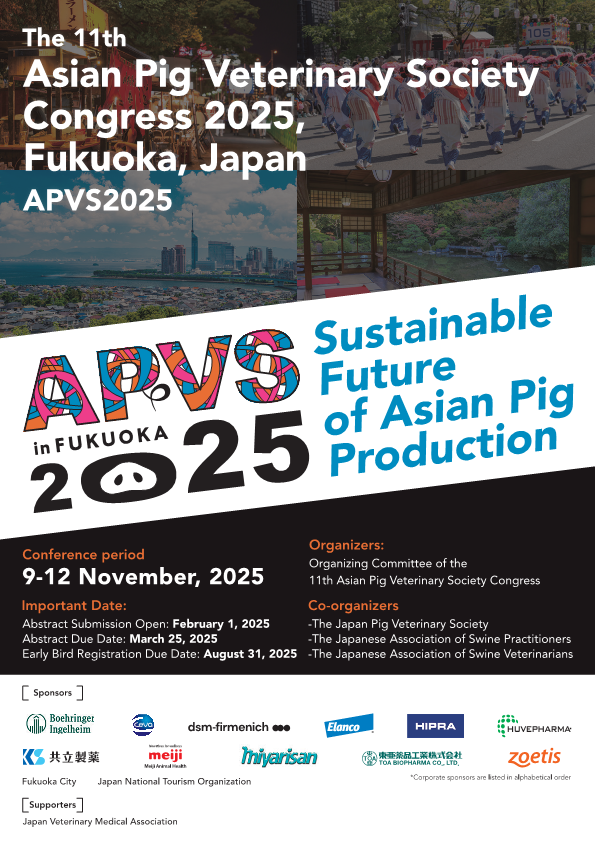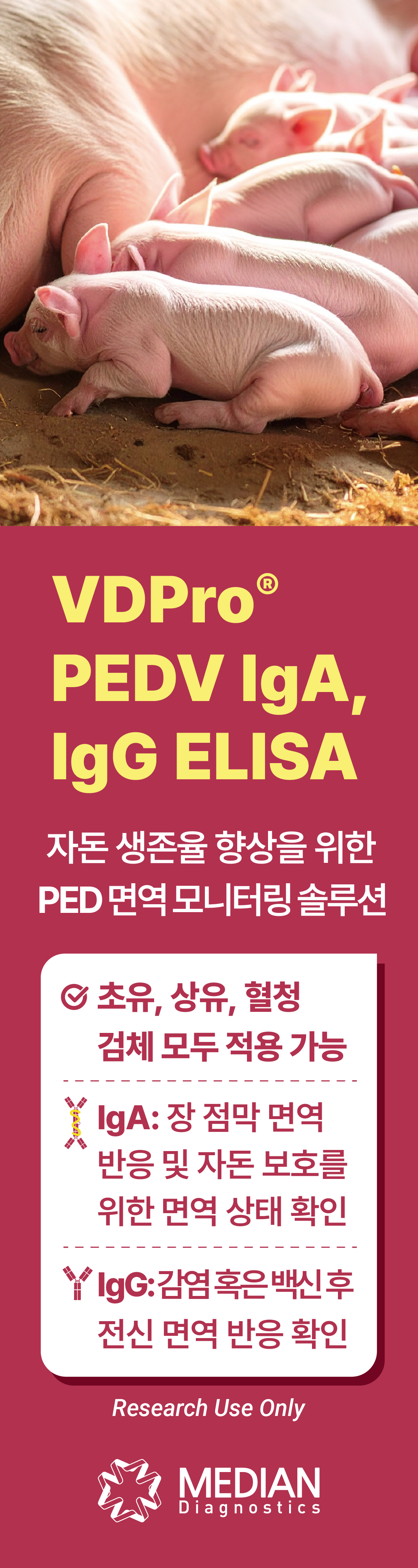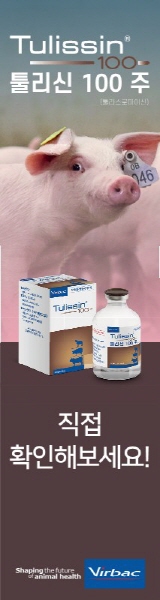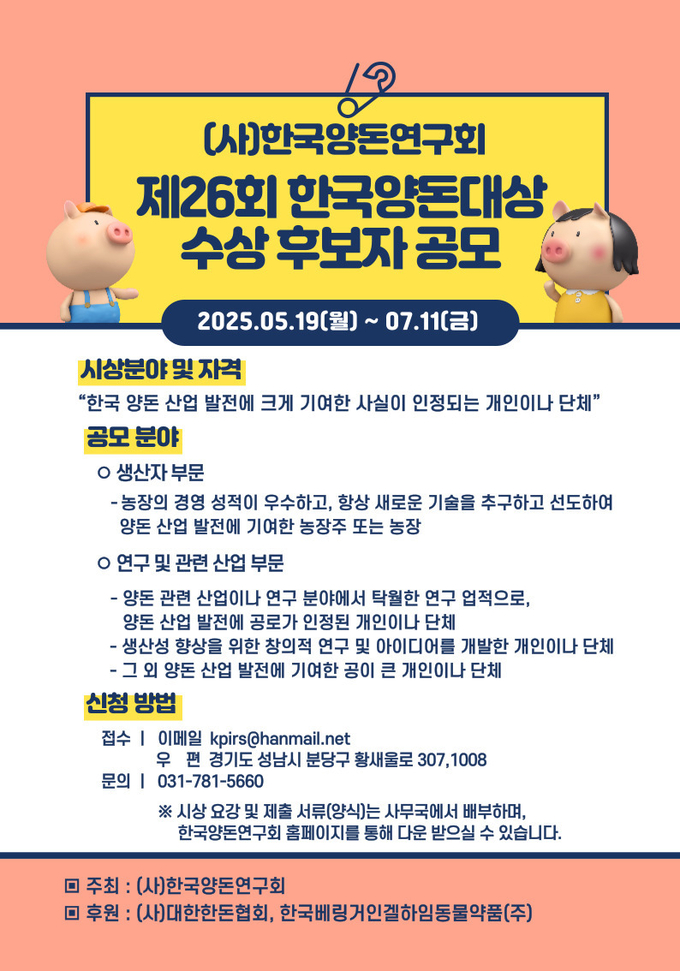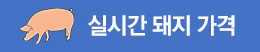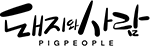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은 철저한 차단방역 실천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긴장감 유지와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24년 10월 강원지역 ASF 발생 관련 보도자료 중

축산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단방역'은 영어인 'Biosecurity(바이오시큐리티)'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는 생물을 뜻하는 'Bio-'와 보안을 뜻하는 '-Security'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생물보안'이 됩니다.
'Biosecurity'라는 말은 인체보건에서도 활용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다루는 실험실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모두 한글로 '생물보안(일부 바이오보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바로보기)에는 '생물보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이란 감염병의 전파, 격리가 필요한 유해 동물, 외래종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입 등에 의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 및 대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도난이나 의도적인 유출을 막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생물학적 물질이 잘못 사용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한다는 협의의 생물보안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생물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물리적이나 기계적인 보안뿐 아니라 인적보안, 정보보안, 물질통제, 이동보안, 프로그램 관리 등의 요소들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을 뜻하는데 여기에 '막는다'는 의미의 '차단'을 사족(蛇足)처럼 더한 말입니다. 두 번 막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차단+ 방역'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보안'이라는 개념보다는 '방역'이라는 행위에 촛점을 맞춰 번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물보안' 본래의 의미를 축소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이 주로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원치 않는 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Bio-exclusion)에 주안점을 두고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장 내부에서 외부로(Bio-containment)', '농장 내부에서 내부로(Bio-compartmentalization)' 등에서의 생물보안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관련 법령이나 과태료 규정뿐만 아니라 양돈 관련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장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나 사람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강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 감염압력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농장 간 질병 공유가 일상화되고, 농장 내 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순환감염되는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단방역'은 '생물보안'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농장을 시작으로 지역, 산업 전체에서 생물보안이 구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경검역도 생물보안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